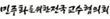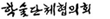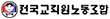대학 공동체의 붕괴와 대학 강사의 삶 (20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09 12:28 조회5,164회 댓글0건본문
대학 공동체의 붕괴와 대학 강사의 삶
교수신문 기고글
2014년 12월 8일 -박중렬 전남대 분회장-
지방의 한 국립대 시간강사는 올 초만 생각하면 쓴웃음부터 나온다. 두 군데 대학에 출강하고 있었는데, 희비가 엇갈렸다. 한 사립대에서는 교양필수과목의 강의전담교수 15명을 뽑는다면서 나머지 40여명을 해고했는데 그 중에 자신이 포함됐다. 반면 800명 중에서 170명을 해고한 다른 한 국립대에서는 그야말로 어찌해서 살아남았다. 혹자는 이리 말할지도모르겠다. “누가 대학의 시간강사를 하라고 등을 떠밀었으며, 연구와 교육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 강의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물론 극히 소수의 견해일 것이고 냉정하게 말해서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일부러 외면하거나 이른바 ‘고상하게 포장’한 것이다. 이런 냉소의 뒤편에는 국가의 백년대계와 대학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대학평가’라는 덫을 만들어 놓고, 대학과 교수와 학생들을 구석으로 몰아대는 교육부가 숨어 있다. 또 이 때문에 대학공동체가 붕괴되고 인간성이 소멸돼가는 대학 현장이 떠오르고, 이 안에서 단지 우두커니 서 있거나 혹은 공명심에 취해 실적을 다그치는 몇몇 대학 관계자도 눈에 비친다.
이들에겐 ‘세월호는 이제 그만’, ‘이제 좀 지겹지 않아’라고 훈계조로 이야기하는 그 누구들처럼 대학의 시간강사가 겪는 슬픔과 그들의 심리적 좌절, 생계 곤란의 아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양이다. 이 때문에라도, 모두 알고 있지만 너무도 쓸쓸한 풍경이라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비정규직 대학 시간강사의 삶을 다시 한 번 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대학 시간강사의 임금이야 1시간당 3만원에서부터 8만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어서 일단 논외로 치고 이들의 법적 지위만을 살펴보자면 이렇다. 시간강사는 대부분 한 대학에서 15시간 미만을 강의하는 단시간 근로자이자 6개월 단위 계약직이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가 없으며 퇴직금도 없다.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지도 못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되지도 못하므로 현재로선 결코 정규직이 될 수 없다. 비정규교수인 이들에게는 6개월마다 학과에서 알려오는 강사 위촉 통보가 목숨 연명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마저 없으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만다.
10년, 15년 넘게 오로지 공부가 좋아서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죄밖에 없었던 그네들이지만, 그들을 ‘교수님’이라고 깍듯이 존대할 때마다 행복해 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들은 2~3시간을 강의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도 없이 왕복 3~4시간을 이동해야 하고, 빈 시간이면 차에서 책을 봐야 하고, 6개월에 15주만 강의할 뿐 방학이 되면 강의료 수입이 전혀 없어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교수님’인 것이다.
이들의 처지를 내버려두고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과 교육공동체라거나 지역 거점대학이라거나 대학경쟁력 몇 위라고 버스에다 덕지덕지 홍보물을 붙이는 기만을 이제는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힘들어하면서도 학생들을 가르쳐왔던 이들의 교육 희생을 슬그머니 감춰두고 이러한 푸닥거리를 강요하는 교육부와 여기에 장단 맞추는 대학은 지금이라도 염치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사람다울 테니까.
한 말씀 더 드린다. 대학이 “상호부조와 협동적 공동체”(김종철)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을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에게 박노해의 「하늘」이라는 시 마지막 구절을 들려드리고 싶다. “아 우리도 하늘이 되고 싶다. / 짓누르는 먹구름 하늘이 아닌 / 서로를 받쳐주는 /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는 / 그런 세상이고 싶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